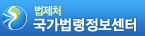「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 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 유무급처리 여부
【회답】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수령이 전제되어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것임.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 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근로기준과-1270, ’04.3.13),
-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 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